연결과 단절: 미술은 어떻게 역사와 만나는가
서동진은 문화평론가이자 계원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이다. 시각예술과 자본주의의 문화/경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글쓰기를 하고 있다. 저서로 『자유의 의지 자기 개발의 의지』, 『동시대 이후: 시간-경험-이미지』 등이 있다.
마닐라 파사이에서
지난여름, 내내 미루던 마닐라행을 결심하게 된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 해 전 오랜 세월 망명 중이던 필리핀 공산당의 지도자 호세 마리아 시손(Jose Maria Sison)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이 연구년을 보내려 찾았던 토론토의 스산한 대기 속에서 전해졌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필리핀을 떠올렸다.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맞아, 추방당했던 과거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아들이 출마하였으며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를 뒤잇는 강력한 후보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역시 문득 필리핀이란 낱말을 입속으로 웅얼거렸다. 진보 진영의 후보로 나선 월든 벨로(Walden Bello)가 박해를 받으며 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새로운 탈식민운동의 전망을 토론하는 어느 온라인 포럼에서 듣게 되었을 때도, 나는 필리핀을 떠올리곤 했다. 그러나 필리핀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막연할 뿐이었다.
냉전 속의 가장 뜨겁고 잔인한 열전(熱戰)을 겪어야 했던 아시아의 탈식민주의 저항의 역사를 탐색하며 그에 대한 기억을 트라우마와 희생, 피해자의 담론 속에 유폐하지 않고 그 시대에 잠재했던 유토피아적 정치를 재발견하려던 내게, 아직도 필리핀은 먼 곳일 따름이었다. 마르코스의 잔인한 독재와 미국에의 철저한 종속 그리고 1986년 ‘피플스 파워’라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인해 그곳은 이곳의 역사와 비근한 운명을 겪은 나라처럼 여겨졌지만, 아시아 탈식민주의적 저항의 운동, 무엇보다 아시아에서의 제3세계 프로젝트의 역사 속에서 필리핀이라는 이름은 내겐 불투명한 곳일 뿐이었다. 반면 비동맹운동의 역사를 개척한 반둥은 내겐 언제나 소중한 곳이었다. 십여 년 전 무조건 그곳으로 가야겠다며 짐을 싼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곳을 넘나들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초토화되기 전의 아시아 역사의 흔적을 찾으려 분주히 쏘다녔다. 물론 책을 읽거나 자료를 섭렵해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책이나 텍스트를 읽는 것과 그곳에 발을 딛는 것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단지 한 장소가 나의 머릿속에 그려내는 관념적 지형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 대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히 그곳과 접촉하고 있다는 환영 같은 것에 의지한 탓은 아니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은 이미 모두 유물(遺物), 흔적이거나 폐허일 뿐이었다.
그러나 십수 년 전 땅거미가 내리는 인도네시아 반둥의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가 열린 건물의 골목 어귀에 섰을 때, 회의에 참여한 인물들이 묵었던 어느 호텔에 방을 잡고 들어섰을 때, 나는 관념적인 추상 속에서 이곳의 역사적 사건과 내가 성장하고 살았던 곳의 숱한 역사적 격변을 연결하던 것과는 다른 무엇이 나를 침범한다는 걸 느끼곤 했다. 직접 발을 딛지 않은 채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경험했다면 그곳은 온전히 과거의 시제 속에 아름다운 기억의 모습으로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당도했을 때, 거기는 더 이상 내가 기억 속에서 안전하게 기릴 수 있는 곳은 아닌 곳이 되어 버리곤 했다. 이제 그곳은 몰라보게 다른 곳이다. 고작해야 운이 좋다면 나는 작은 표지판과 흐릿한 거리의 윤곽을 통해 가까스로 그 장소가 사진이나 문서를 통해 알던 곳임을 알아챌 수 있을 뿐이다. 과거 이곳과 내가 사는 곳을 이어주던 역사적인 고리, 이를테면 독립 이후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깃들어 있던 유토피아적인 열정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환상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반둥회의가 기약했던 비동맹운동은 ‘세 개의 세계’가 있음을 선언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화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독립국가들,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 사이의 연대를 수립하려 했다.1 그것은 탈식민주의적 질서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수립하며 민중적 발전의 전망 위에 독립된 나라를 건설하려는 황홀한 전망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모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후에 소멸하였다.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제3세계라는 정치적, 문화적 공간 역시 자취를 감춘 것이다. 세 개의 세계로 다극화되어 있던 세계는 미국 주도의 일방적 헤게모니에 의해 주도되는 단극적 세계 질서로 바뀌었다. 그를 가리키는 이름은 물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였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뿐인 세계 속에서 생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그 세계는 운명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 ‘신냉전체제’니, 새로운 ‘다극적 질서’, ‘신 반둥체제’니 하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진단들이 심심찮게 거론되는 것도, 역시 그 때문이리라.
그러므로 내가 찾은 곳이 더없이 낯설게 다가온 까닭은 거기가 내가 방문한 적 없는 외지(外地)여서가 아니라, 그곳을 나와 연결하는 상상의 공간이 부재한 탓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 그곳들은 외지라는 점에서는 낯설지만, 은연중 익히 알던 어떤 곳처럼 내게 다가오기 십상이다. 그곳들은 내게 이미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수많은 텍스트에서 재현되고 환기되고 심지어 우상화된 장소들이다. 나의 예술적 향유의 경험도 지적 사고의 이력도 모두 그 장소에서 발원한 것이고, 나는 어쩌면 그곳을 이미 찾았던 곳인 양 가까이 느낀다. 이는 탈식민 저항의 시기에 제3세계의 지식인들이나 혁명가들 또는 노동자들이 서로의 장소를 방문했을 때 느꼈을 친숙함과는 아주 다른 것일지 모른다. 그들은 내가 느끼고 있던 익숙함과 낯섦의 관계를 전도시킨 그러한 익숙함과 낯섦의 경험을 습득했을 것이다.2 그들에게 똑같은 식민 지배를 받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른 곳의 골목과 인물들이 더욱 친숙하고 익숙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의 역사-정치적 감각은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곳들은 이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생경한 곳으로 멀어져 있다.3
아시아의 개념주의?
언젠가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던 곳이 불현듯 까마득히 낯선 곳으로 다가올 때 그 낙차를 줄이려 발버둥치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어쩌면 ‘역사적 상상’일 것이다. 역사적 상상이란 주어져 있던 것들을 기억 속에 끌어모아 그에 하나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우리는 먼 거리와 떨어진 시간을 잇고자 갖은 애를 쓸 수 있다. 세계화 이후의 시대에 범람하는 연결의 환상은 그 어느 때보다 분리와 단절을 생산한다는 점을 숨긴다. 그러므로 내가 마닐라의 어느 서점에서 우연히 손에 넣은 도록에서 비엔날레가 지배하는 글로벌 아트(global art)의 시대에선 더 이상 상상하기 힘든 미술의 역사적 장면과 조우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닐라를 찾자마자 이런저런 정보를 뒤지다 찾아낸 인쇄소를 겸하는 어느 미술 전문 서점에서, 나는 책 선반 어느 구석에 놓인 먼지 뒤덮인 책 한 권을 뒤적이게 되었다. 그 책은 『1970년대, 오브제, 사진 그리고 도큐먼트』라는 도록이었다.4 같은 이름의 전시를 위해 출판된 이 도록은 필리핀의 개념미술의 역사를 필리핀 현대미술사 속에 기재하려는 흥미로운 사색을 보여 주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이 전시는 사회적 리얼리즘(social realism)으로 대표되는 미술적 실천이 필리핀 현대미술을 지배하던 ‘이식된 모더니즘’에 맞서 대립한 유일한 흐름이 아님을 역설하려 마련된 것이었다. 현실과 두절된 미술을 극복하기 위해 민중적 현실을 재현하는 데 몰두했던 사회적 리얼리즘이 식민적 모더니즘에 대항하고자 했다면, 도록의 저자는 오직 사회적 리얼리즘만이 그런 실천을 했던 것은 아님을 밝히려 애쓰고 있었다. 도록의 저자는 이를 입증하고자 필리핀 문화센터(CCP: Cultural Center of the Philippines), ‘상점6(shop6)’에서의 전시, 그리고 필리핀미술대학(UPCF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ollege of Fine Arts) 출신 작가들의 작업들이5 1970년대 필리핀 미술에 “똬리를 틀고 앉아있던 모더니즘적 감수성을 비판하고 조롱했던 급진 미술의 현장(hotspots)으로 이바지”했다고 강변한다.6
그것은 나에게 어쩔 수 없이 그즈음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란 전시를 떠올리게 했다. 이 전시 역시 한국의 실험미술이 “보수화된 기성세대의 형식주의 모더니즘에 반발”하고 “반-미학과 탈 매체를 선언”했다고 자리매김하고 있었다.7 나는 이 전시와 우연히 발견한 도록 사이에 놓인 ‘연결’에 언뜻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는 전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전개되는 미술사적 서사이다. 그러나 다른 두 미술사적 서사가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내겐 간단히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국의 미술사에서 개념미술이 모더니즘 비판의 미술사적 계기로서 자리매김했음을, 그로써 아시아에서의 미술사 역시 서구의 미술사와 동등한 궤적을 그리며 나아갔음을 암시한다. 물론 한국에서의 실험미술을 온전히 개념미술로 환원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것은 다분히 개념미술의 경향뿐 아니라 훗날 퍼포먼스로 알려지게 될 해프닝이나 바디 아트와 같은 요소들 역시 포함한다.
그러나 모더니즘 이후의 개념미술이라는 미술사적 서사는 모더니즘 이후 그것의 비판으로서의 개념미술이라는 정상 궤도를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기만 했을까. 성완경이 『글로벌 개념주의(Global Conceptualism)』에 기고한 인상적인 에세이인 「지역적 맥락으로부터: 남한의 개념 미술」은 한국에서의 개념미술의 역사적 서사화에 깃든 곤란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8 이를테면 성완경은 남한에서 개념미술가들의 첫 세대로 알려진 “백색 단색화파”의 경우, 그것은 일본의 이우환에게서 영향받은 “모종의 민족주의적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것이자 “개념주의 자체와는 모순되는 혼종적인 미적 상품일 뿐”이라고 언급한다.9 물론 1970년대 중반 이후 김용민, 성능경, 김용익 등이 참여했던 ST(Space and Time: 공간과 시간) 그룹에 의한 반-형식적 실천으로서의 개념주의적 작업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반-형식의 형식 비판적 실천과 현실의 비판적 재현 사이의 긴장을 극복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 성완경은 민중미술이 비판적 리얼리즘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기울어 있었지만 또한 그 속에는 개념주의적 계기들이 장착되어 있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물론 이는 개념주의가 “예술과 삶의 거리를 극복하고 제도적 예술 장치를 비판하며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는” 예술적 실천의 경향으로서 정의될 경우에 해당한다.10 그러나 그것은 개념미술의 세계사를 서술하는 데 마땅히 도입되어야 할 공준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더니즘 이후의 개념미술이 아니라 모더니즘 이후 리얼리즘과 어색하게 맞닥뜨린 개념미술이라는, 조금은 낯선 미술사적 국면과 마주치게 된다.
모더니즘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물론 표준적인 미술사적 지식을 따르자면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아니면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이 위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어긋난 혼란스러운 미술사적인 시계열과 만나게 된다. 리얼리즘 뒤에 당도하는 모더니즘이 아니라 모더니즘 이후에 도착하는 리얼리즘? 모더니즘의 위기와 모순에 대응하는, 모더니즘 이후의 연대기적 후속으로서의 개념미술? 전자는 미술사의 표준적인 서술에 도전한다. 그것은 모더니즘에 앞선 항이던 리얼리즘을 모더니즘의 뒤에 자리잡게 한다. 후자는 모더니즘 이후에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개념미술로서 아시아 미술의 역사적 장소를 배정함으로써 표준적인 미술사에 아시아 미술의 역사를 안전하게 통합시킨다. 그러므로 전자가 서구적 미술사의 서사적 무의식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한다면, 후자는 아시아의 미술사를 보편적 미술사와 조응하는 것으로 추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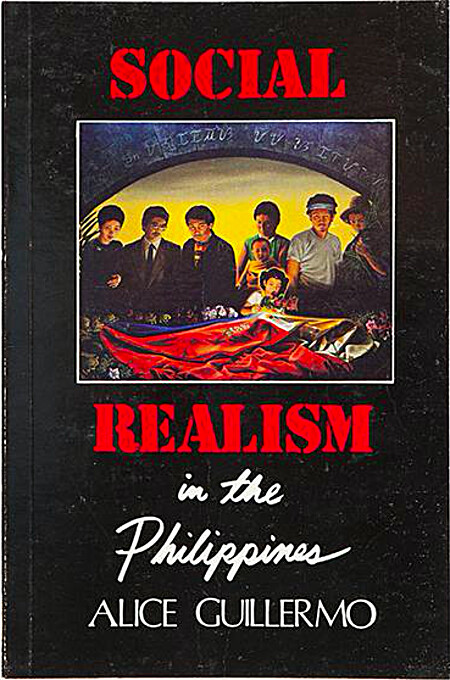
내가 마닐라의 서점을 방문한 이유는, 실은 어떤 한 권의 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 책은 앨리스 길레르모라(Alice Guillermo)라는 빼어난 여성 비평가가 쓴 『필리핀의 사회적 리얼리즘(Social Realism in the Philippines)』(1987)이었다.11 나는 필리핀의 사회적 리얼리즘이 한국에서의 민중미술에 대응하는 필리핀 현대미술의 실천이라 짐작했고 그것의 참모습이 무엇이었는지가 몹시 궁금했다. 필리핀 사회적 리얼리즘의 작품들을 볼 기회가 없던 내게, 그 책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 줄 가장 중요한 이차적 정보였다. 용케 나는 서점 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인연으로 비매품으로 비치되어 있던 재고 한 권을 운 좋게 구할 수 있었다. 서점을 나오자마자 감격한 마음에, 옆에 있는 볼품없는 커피숍에서 그 책을 서둘러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구한 필리핀 개념미술의 가치를 치켜세우는 도록과의 거리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이는 리얼리즘-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동시대 미술로 이어지는 표준적 미술사적 서사와는 어긋나는, 아시아에서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예술적 실천의 경과를 나름 가늠해 보려는 고민이었다.
글로벌 아트 이후: 미술사와 세계사
알다시피 비엔날레와 아트페어가 지배하는 동시대 미술의 현장은 세계 모든 곳의 미술이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이스탄불과 베를린, 뉴욕, 서울, 도쿄, 바르셀로나, 상파울로의 미술은 모두 동등한 미술 형식과 관심을 공유한 시늉을 한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같은 시간 속에 머물고 있음을 축복한다. 우리는 모든 곳이 같은 현재의 시간 속에 배열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서로가 처해 있는 다른 역사적 시간을 은폐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터 오스본(Peter Osborne)이라는 미술비평가 겸 철학자는 동시대 미술의 시간성인 ‘동시대’란 이접적으로 결합된(disjunctive conjunction) 시간성이라 주장한다.12 이는 걸핏 운위되는 ‘동시성의 비동시성’과 같은 상투 어구와는 다른 역사적 시간성을 가리킨다. 이는 전근대와 근대, 후기 근대가 복잡하게 착종된 현재성의 시간으로서 동시대성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 안에서 서로가 차지하는 위치야말로 시간을 둘러싼 경험의 원인임을 깨닫도록 촉구한다. 시각예술을 지배하는 동시대라는 시간성의 형태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성을 위축시키거나 억압함으로써 가능하다. 과거와 미래가 각기 기억과 기대(expectation)라는 모습으로 현재 속에서 자신을 자리잡게 했다면, 오늘날 주목(attention)을 통한 현재의 시간적 경험이 기억/기대와 결부된 과거/미래란 시간 경험의 구조와 맺는 관계는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3 기억이 각각 다른 현재의 임의적인 호명에 따라 유행과 라이프 스타일, 세대적 문화와 같은 것으로 과거를 탈역사화한 채 불러내어 현재의 문화적 소비를 위한 저장고처럼 남용한다면, 기대라는 시간 경험과 관련한 미래는 거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아마 한국에서의 시각예술의 역사에 대하여 얼마쯤 식견이 있는 이들이라면 ‘민족미술’이란 말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시각예술의 가장 강력한 흐름이었던 민중미술은 또한 민족미술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예술적 실천을 명명하고자 했다. 민족미술은, 민족주의적 미술을 가리키는 이름도 아니고 민족을 재현하는 데 골몰하는 미술을 지시하는 것도 아닐 테다. 그렇기에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가 단순히 허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조롱하며 민족주의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공동체의 성원들이 어떻게 민족이라는 상상을 경유함으로써 자신들의 역사적 시간의 서사를 생산하고 나아가 유토피아적인 정치를 발안할 수 있었는가를 따지고자 했던 베네딕트 앤더슨의 생각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14 그런 생각에 따를 때 민족미술이란 관습적 미술사 서술에서 말하는 통사적 연대기, 그러니까 리얼리즘-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식의 시대구분이 도무지 먹히지 않는, 세계 인구의 8할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미술의 기구한 역사적 지평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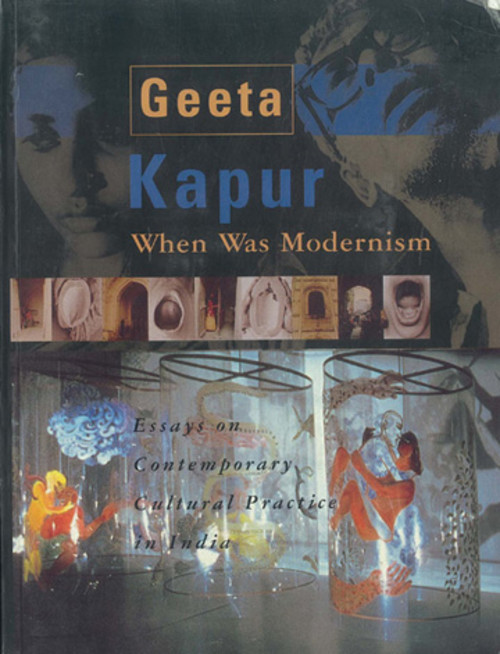
인도의 미술비평가인 기타 카푸르(Geeta Kapur)는 『모더니즘은 언제였나: 인도에서의 동시대 문화적 실천(When Was Modernism: Contemporary Cultural Practice in India)』(2000)이라는 신랄한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다. 몇 해 전 『옥토버(October)』 저널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인터뷰어인 사로니 마서(Saloni Mathur)가 언급하였듯, 이 저작은 “글로벌 동시대 미술(global contemporary art)”이나 “탈식민 모더니즘”을 거론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할 일종의 정전(正典)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15 2차대전을 전후하여 탈식민을 경험한 제3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은 서구가 이식한 미술을 통해 자신의 미술을 개시하였다. 그것은 당연 모더니즘으로서의 미술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더니즘은 자신의 삶의 세계를 재현하는 리얼리즘이 형성될 기회를 건너뛴 모더니즘이었다. 제3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더니즘이란, 리얼리즘이 더 이상 현실을 재현하거나 상징화하는 데 유효하지 않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집요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모더니즘이 아니라, 서구에서 이식된 박제화된 모더니즘이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모더니즘을 통해 본격화된 자율화된 예술로서의 미술을 통해 이식되었다. 그렇기에 기타 카푸르의 “모더니즘은 언제였나”란 물음은 각별하게 들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탈식민적 미술사에서 모더니즘은 어떤 시간대에 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식민적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으로서 탈식민적 리얼리즘이 등장하는, 역행하는 미술사적 시기 구분을 예고하며, 현대미술이 존재하기 위해 뒤집어써야 했던 자신의 존재 명분, 즉 모더니즘 미술일 때만 미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괴한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항의 역시 준비한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시대가 언제였는지를 따지는 것은 미술의 역사를 재현하는 시간적 서사에 대한 이의제기이다. 그렇기에 단색화나 모노크롬으로 상징화되는 모더니즘 미술의 물신화된 형식을 반복하던 한국 현대미술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비판하며 등장한 민중미술은 리얼리즘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리얼리즘을 생산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민족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이다. 민중미술은 이미 보수적 민족주의가 점유하여 닳을 대로 닳아 있던 민족이란 개념을 경계하며 민중이란 어휘를 선호했지만, 그즈음 절정을 이루었던 민족문학론이나 민족경제론 같은 것에서 제시하고 있던, ‘민족’이라는 개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자리잡고 있던 민족이란 개념은 우리가 처한 공동의 현실을 지시하는 또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은 특정 영토에 거주하는 주체를 지시하는 개념이기는커녕 외려 그런 주체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재현하고 서사화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였다. 리얼리즘의 성립 조건은 현실의 핍진한 재현을 위한 양식과 기교, 수사학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미술이 재현해야 할 대상으로서 ‘현실’이 정립될 때 그리고 이를 의식적으로 캐물을 때 리얼리즘은 성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민족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족은 외적 현실을 지시하는 이름이자 주체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던 셈이다.
앞서 우리는 모더니즘 비판으로서의 개념미술이라는 미술의 일반사 혹은 세계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과, 한편으로는 역시 모더니즘 비판으로서의 사회적 리얼리즘이라는 필리핀의 미술사의 딜레마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한국에서 실험-개념미술과 민중미술의 공존이라는 상황 역시 떠올려 보았다. 이는 불가피하게 글로벌 미술이라는 동시대 미술의 또 다른 모습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비엔날레나 도큐멘타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미술 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의 예술적 실천을 표준화한다. 마치 그 해의 유행처럼 되풀이되는 주제와 뻔한 비평적 어휘의 범람은 세계미술을 실현하기는커녕 진정한 의미의 세계미술을 저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6 반면 서로 다른 국가적인 궤적 위에서 미술적 실천을 했던 아시아 나라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그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독자적 실천을 통해 미술사 위에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각기 민족적 현실을 재현하는 실천을 기획하며 식민적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미술을 현실의 재현이라는 문제로 귀환하도록 이끌었을 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지평에 자신들의 실천을 등록했다.
짐짓 모든 곳의 예술이 연결된 듯 시늉하는 ‘글로벌 컨템포러리(global contemporary)’ 미술은 어떤 특수한 공간과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시공간적인 무(無)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반면 앞선 시대의 잊힌 미술, 즉 식민적 모더니즘에 저항하며 모더니즘 이후의 리얼리즘 미술을 내세우고 민족이란 이름을 경유하며 현실을 재발견하고자 했던 탈식민의 미술이야말로 세계미술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각 나라의 미술은 한 번도 서로를 눈여겨본 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미술사 연구를 통해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역사를 개관하는 어느 글에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모던 신미술운동’의 역사를 엿들을 수 있다. 식민적 리얼리즘이 재현했던 식민주의자와 관광객을 위한 심미적 현실에 저항하며 1938년 수조노조(Sudjonojo)의 주도하에 결성되었던 인도네시아 화가 동맹(PERSAGI: Perastoean Ahli Gambar Indonesia)의 사회적 리얼리즘 운동. 비동맹운동의 수장이었던 수카르노가 이끈 탈식민적 독립국가 건설의 기획이 좌절된 이후 등장한 수하르토(Soeharto)의 신질서 체제하에서 현실을 깡그리 외면한 모더니즘 예술이 성행하는 상황에 저항하려 했던 신미술운동(GSRB: Gerakan Seni Rupa Baru)의 개념주의적이거나 팝아트적인 실천.17
이 모두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전개되었던 미술적 실천의 역사가 서로 분기하면서도 수렴하는 모습을 역력히 증언한다.18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민족적 예술의 자장 안에서 예술적 실천을 하였지만 우리는 세계사의 시공간 속에서 서로 연결된 세계미술을 실천하고 있었다. 세계사는 서로를 모두 하나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이를 생산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역사적 시대의 중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동시대 글로벌 미술의 황폐한 시공간적 불모성은 더욱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미술적 실천의 연결을 이룩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은 미술에 전가된 책임은 아닐 것이다. 탈식민적 세계를 향해 치닫던 세계 각 곳에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자각적 경험이 미술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을 지피며 서로를 은밀하게 연결해 주었듯, 우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의 명령하에 통일된 세계를 돌파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연결은 세계화란 관념이 상상하는 그릇된 연결의 미망, 모두가 시장 법칙의 지배에 한결같이 복종함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폭력적 환상과 ‘단절’을 꾀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음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서동진, 박소현 편, 『비동맹 독본』(현실문화, 2020). ↩
-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인쇄자본주의가 멀리 떨어진 대륙의 인물들을 연결해 주었으며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실은 각기 다른 공동체가 공유하는 운명임을 자각하는 국제주의적 상상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묘사한 바 있다. 앤더슨이 『세 깃발 아래에서(Under three flags)』란 저작에서 제시했던 필리핀과 스페인, 쿠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잇는 문학적 사슬과 그에 투입되어 있던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변증법적 관계는 훗날 반둥회의를 전후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투쟁 속에서도 고스란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구(舊)제3세계에서 전개된 ‘연결과 연대’의 감각과 의식을 전하는 다양한 전시와 저술을 여기에서 모두 열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그러한 전시의 국내 사례로서 《연대의 홀씨》(광주 아시아문화전당, 2020)를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
-
그런 점에서 최인훈의 『광장』이나 『태풍』과 같은 소설의 비상함은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불과 수십 년도 되지 않은 그때, 최인훈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자기 소설 속에 도입한다. 『광장』에서 주인공이 인도로 향한다는 것이나, 여전히 미독립 상태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군 장교가 또 다른 식민영토인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Sukarno)라는 민족주의자 지도자에게 감화받고 반식민주의 투쟁에 가담한다는 설정은 기이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정치적 상상의 지리학을 제시한다. 물론 이는 최인훈에게 고유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진보적인 잡지였던 『청맥』과 같은 매체는 그즈음 폭발하고 있던 반식민 투쟁의 현황을 빈번히 소개하였고, 이는 당시 남한의 식자층들이 상상했던 장소의 원근감이 무엇이었을지 추측하도록 해 준다. ↩
-
Ringo Bunoan, The 70s: Objects, Photographs, and Documents (Ateneo Art Gallery, 2018). ↩
-
필리핀 문화센터는 독재자 마르코스의 처였던 이멜다 마르코스(Imelda Marcos)의 지시로 설립된 문화센터로, 아시아의 예술 메카가 될 것임을 표방하였으며, 설립 이후 모더니즘과 추상미술을 적극 지원하였다. 반면 《상점6》은 로베르토 차베트(Roberto Chabet)가 기획한 필리핀 미술사의 대표적인 개념미술 전시로서, 계엄령하의 마르코스 체제에서 유아식 상표인 거버의 병에 마르코스의 사진을 담는 등의 다양한 레디메이드(ready-made)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 전시는 갤러리의 주인이 전시 첫날 경악을 하며 전시장을 폐쇄하자, 전시에 호의적인 어느 가문의 도움으로 마닐라 파사이 상점가의 한 임시 공간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는 훗날 ‘상점6’이라는 전시 공간로 알려지게 되었다. 필리핀미술대학은 로베르토 차베트가 교수로 취임한 이후 필리핀의 동시대 미술의 산실이 되었던 곳으로 다양한 개념미술 작가 세대들은 이 대학 출신이었다. ↩
-
Bunoan, The 70s, 21. ↩
-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https://www.mmca.go.kr/exhibitions/exhibitionsDetail.do?exhFlag=3 ↩
-
Wan-kyung Sung, “From the Local Context: Conceptual Art in South Korea”, Jane Farver ed. Global Conceptualism: Points of Origin 1950-1980 (New York: Queens Museum of Art, 1999), 119-125. ↩
-
Sung, From the Local Context, 119-120. ↩
-
Sung, From the Local Context, 124. ↩
-
Alice Guillermo, Social Realism in the Philippines (Manila: ASHPODEL BOOKS, 1987). ↩
-
Peter Osborne, Anywhere or Not at All: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London & New York: Verso, 2014), 22-25. ↩
-
피터 오스본은 위의 책에서 예술의 시간에 대해 언급하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영혼의 시간’에 관한 서술을 참조한다. 그것은 과거/현재/미래가 주체의 지향 속에 존재하는 세 겹의 현재, 즉 기억/주목/기대와의 관계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피터 오스본은 ‘동시대적인 것’을 기대와 기억이 탈구되거나 변형된 것으로서 오직 주목만이 횡행하는 시간적 경험의 형태로 규정한다. Osborne, Anywhere or Not at All, 175-211. ↩
-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서지원 옮김 (길, 2018). ↩
-
Saloni Mathur, “Ends and Means: A Conversation with Geeta Kapur”, October 171, 2020. ↩
-
나는 여기에서 세계문학을 둘러싼 문학계 내에서의 논쟁을 떠올린다. 세계문학이란 모든 나라의 문학을 모아 놓은 문학을 가리키는 이름도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정전의 지위를 이룩한 문학적 성취를 지시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세계문학은 제아무리 지역적인 독자들 사이에 읽히고 지배적인 언어로 번역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세계성을 실현하는 문학을 말하는 것일지 모른다. 또한 지역문학이나 민족문학을 토착적 문화의 자족적인 자기표현의 원리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세계 체제가 미치는 힘과 그 효과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리라. 그런 점에서 한국의 민족문학론을 이끌었던 『창작과비평』이 매년 간행했던 문학논집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이란 제명을 달고 있었던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문학의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동시대의 글로벌 미술에 대응하여 세계미술이라는 미술사적 범주를 상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비평가들과 미술사가들이 세계미술과 글로벌 미술의 차이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 모든 쟁점을 여기에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세계문학과 관련한 근년의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김용규 외 엮음,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 현암사, 2014. 아울러 세계미술과 동시대 글로벌 미술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동진, 「남반구의 비엔날레는 새로운 삼 대륙 예술 인터내셔널을 만들 수 있을까?」,『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19: 초국가적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2019). ↩
-
이들 작업의 일부는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이 공동으로 기획한 《세상에 눈뜨다》란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신미술운동의 작품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해당 전시의 도록을 참조하라.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국립현대미술관, 2019. 한편 사회적 리얼리즘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의 미술적 실천의 계보에 대해서는 다음이 길잡이가 될 것이다. Roger Nelson, Modern Art of Southeast Asia: Introductions from A to Z (National Gallery Singapore, 2019), 192-196. ↩
-
강지용, 「인도네시아의 ‘모던 신미술운동’에 나타난 사회비판적 예술시각」, 『현대미술사연구』 제36집, 현대미술사학회, 2014. ↩
